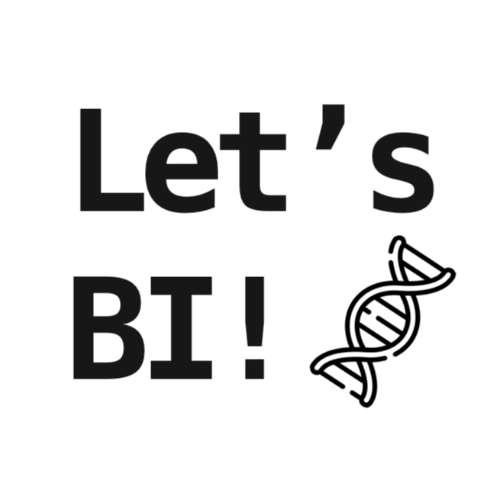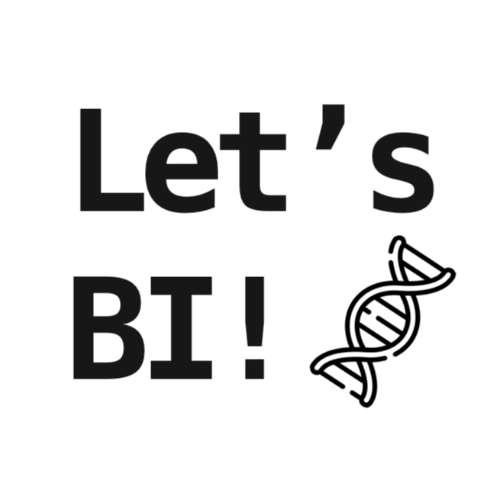대한민국이란 배의 선장은 누구? 격주 목요일 오전 8시, 따끈따끈한 생물정보학 업계 소식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
|
|
안녕하세요, 생정해요 편집부의 파랑새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때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뱃속에 떠다니는 균의 이름을 묻는 일이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DNA의 작은 변화를 찾는 일은 누군가의 눈엔 하찮아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쌓은 작은 벽돌이, 10년 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수 있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
이번화와 다음화는 21대 대선을 맞이하여 대선 특별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은 정치와 땔래야 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기금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영향력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러한 충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연구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해, 바이오 업계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담았습니다.
이번화부터 요주의 논문에는 IEEE 와 iMeta 논문도 포함됩니다. 덕분에 제가 보는 저널은 이제 20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쓰는데 꼬박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가치있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번화를 통해 독자분들이 좋은 논문과, 각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 25년 5월 14일 연구실에서, 파랑새 |
|
|
《Nature (IF: 69.5)》
논문명: Brief antibiotic use drives human gut bacteria towards low-cost resistance
발간날짜: 2025/04/23
저자: Eitan Yaffe et al.
이 논문은 단기간의 항생제 사용이 인간 장내 미생물군집 내에서 항생제 저항성을 어떻게 유도하고, 그 변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전례 없는 해상도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기존에는 항생제 내성의 진화를 대부분 시험관(in vitro)이나 동물 모델에서 연구해 왔으나, 이 연구는 건강한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5일간 ciprofloxacin을 투여하고, 20주간 960개의 분변 샘플을 종적 수집하여, 장내 공생균의 진화적 반응을 직접 추적했습니다. (말도 안되게 귀한 데이터입니다)
연구진은 PolyPanner라는 신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5,665개의 종 수준 유전체와 230만 개의 다형성 변이를 식별했고, 그중 513개 집단에서는 선택적 스윕(selective sweep)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gyrA 유전자의 83번 아미노산 위치에서 발생한 S→F 또는 S→L 돌연변이가 전체 sweeping 변이 중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었으며, 이는 fluoroquinolone 내성의 주요 기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gyrA 변이는 대부분 참여자 개체 내에서 de novo(새롭게) 발생했고, 측정 가능한 fitness cost 없이 10주 이상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logistic 회귀 분석 결과, 항생제 노출 전 개체 내의 균 풍부도와 항생제 반응 시 급격한 감소폭이 gyrA 변이의 발생 가능성(evolvability)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는 짧은 항생제 노출은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고, 짧은 노출만으로도 장내 공생균에서 저비용 저항성이 쉽게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실증합니다. 이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임상 및 공공보건 전략에 재고를 요구하며, 장내 미생물군의 유전적 적응 능력을 종적 메타유전체 수준에서 정량화했다는 점에서 생물정보학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
|
|
《Genome Biology (IF: 18.7)》
논문명: Peak analysis of cell-free RNA finds recurrently protected narrow regions with clinical potential
발간날짜: 2025/04/23
저자: Pengfei Bao et al.
이 논문은 혈장 cell-free RNA(cfrna) 데이터에서 생물학적으로 보호받는 좁은 cfRNA fragment를 탐지하고, 이들 정보를 진단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cfPeak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cfRNA는 단편화된 채로 순환하지만, 일부는 단백질 결합, RNA 구조, EV에 의해 보호되며 특정 질환 상태에서의 조직 기원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cfPeak는 기존 CLIP/RIP-seq 전용 peak caller와 달리 low-abundance, 짧은 fragment에 특화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colorectal cancer, oral cancer 등 다양한 액체생검 응용 사례를 제시합니다.
단일 세포 유래 다형성, EV sorting site, RNA 구조 등 다양한 생물학적 보호 요소와의 연관성을 통합 분석하며 cfRNA fragmentomics 분야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
|
|
《iMeta (IF: 6.6)》
논문명: Temporal response patterns of human gut microbiota to dietary fiber
발간날짜: 2025/04/22
저자: Xiaotong Lin et al.
이 논문은 식이섬유 섭취에 대한 장내 미생물군집의 시간에 따른 반응을 고해상도로 추적한 연구입니다.
기존 연구는 보통 pre-post 두 시점만을 비교하지만, 이 연구는 2주간 매일 분변 샘플을 채취하고 shotgun metagenomics, 대사체 분석, CGM 데이터와 통합하여 미생물의 동적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귀한 데이터..)
시간 지연 분석(time-lagged multi-omics)을 통해 특정 미생물 군집의 증감과 혈당 조절 지표 간의 관련성을 규명했고, 이 과정에서 maleic acid, 4-Pyridoxic acid 등 대사물질이 잠재적인 매개물질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Bifidobacterium, Faecalibacterium 등 SCFA 생산균이 섬유소 섭취 초기에 빠르게 증가하고, 이들 군집은 특정 carbohydrate-active genes를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
|
|
《Briefings in Bioinformatics (IF: 6.8)》
논문명: SVHunter: long-read-based structural variation detection through the transformer model
발간날짜: 2025/04/15
저자: Runtian Gao et al.
이 논문은 롱리드(long-read) 시퀀싱 데이터에서 구조적 변이(SVs)를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도구 SVHunter를 제안합니다.
구조적 변이는 게놈의 50bp 이상 크기에서 발생하는 유전자 삽입, 결실, 중복, 전위 등의 변이로, 여러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반복서열이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편입니다.
SVHunter는 CNN을 통해 지역적 특징을, transformer를 통해 전역적 패턴을 학습하고, 이후 mean-shift clustering을 통해 구조적 변이의 브레이크포인트를 정밀하게 클러스터링합니다.
PacBio 및 ONT 데이터 기반 벤치마크 결과, SVHunter는 기존 도구들(Sniffles2, SVIM 등)보다 F1-score가 높았고, coverage가 낮은 상황에서도 견고한 성능을 보여 임상적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IEEE TCBB (IF: 4.6)》
논문명: SRPM-SOL: A Structure Robust Protein Multimodal Model for Solubility Prediction
발간날짜: 2025/04/14
저자: Wenhui Ge et al.
이 논문은 단백질 용해도(solubility) 예측을 위해 다양한 feature를 통합한 새로운 멀티모달 모델인 SRPM-SOL을 제안합니다.
기존 모델은 sequence와 structure만 활용했지만, SRPM-SOL은 ESM3 백본을 바탕으로 1차 서열, 2차 구조, 구조 신뢰도(pLDDT), SASA, Gravy score 등 다양한 feature를 활용합니다.
특히 구조 예측의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해 residue-level pLDDT 정보를 활용한 구조 견고성(structure robustness) 전략이 도입되었습니다.
벤치마크 데이터셋(PDE-SOL)에서 SRPM-SOL은 accuracy, F1-score, MCC에서 기존 모델(CoupleNet, ProtSolM, DeepSol 등)을 모두 상회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
|
|
트럼프가 쏘아올린 큰 공
'미 NIH, 해외 연구비 지원 9월말까지 중단'
마치 2년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R&D 예산 대폭 삭감이 국제협력 연구에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NIH는 해외 기관과 연구협력 지원을 9월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언스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NIH 지원 해외연구는 약 4억달러 (5600억원) 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연구소인 에코헬스얼라이언스로 인해 촉발된 조치인데요, NIH 로 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해당 연구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로 의심받는 중국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에 연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원금과 관련된 한국 연구소도 적지 않은 만큼,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
|
생정해요 14편과 15편에서는 21대 대선을 맞아 주요 후보들을 바이오와 제약, 넓게는 과학기술 투자의 측면에서 비교합니다. 해당 사설은 특정 후보 혹은 정당을 지지하는 글이 아니며, 작성시점에 공개된 공약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의 리더는.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안팎으로 위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계속되고, 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이미 한발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 속에 있고, AI 기술은 세상을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박사 한 명의 연봉보다 비싼 범용 AI가 곧 등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작 이 거대한 변화를 헤쳐 나가야 할 한국이라는 배에는 아직 확고한 선장이 없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떤 리더에게 조종간을 맡길지에 따라 한국과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생정해요는 이번 편과 다음 편에 걸쳐 주요 대통령 후보 3인의 공약과 입장을 심층 분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세 후보가 내세운 핵심 공약을 비교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먼저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산업을 하나의 거대한 산업 육성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AI 3강 도약과 AI-의료 융합을 핵심 축으로 내세우며, GPU 5만 개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 공공의료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계획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그는 공공의료 사관학교와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역 기반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민 주치의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은 의료의 접근성과 효율성 강화를 겨냥한 정책입니다. 다만, 이 후보의 AI 및 바이오 전략은 산업 중심의 굵직한 청사진에 비해, 실제 에너지 인프라나 의료산업의 세부 실행 방안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반면 김문수 후보는 과학기술 생태계의 제도와 인프라를 먼저 정비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을 보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학특임대사 제도, 실패한 연구도 인정하는 ‘성실한 실패 인증제’ 같은 제안은 단지 연구개발 자금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과학기술을 국가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설립,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은 바이오산업을 국제 협력과 함께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어요. 의료정책에서는 난임 치료, 산후지원, 치매책임제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공공책임 강화를 강조했고, 원전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계획은 의료·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정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는 바이오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람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노벨상, SCI급 논문 우수자에게 과학연금을 주고, 출국 시 공항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제도는 과학기술인을 ‘국가의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에서도 기존 제도의 구조적 개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과잉 소송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은 의료계의 실질적 요구에 가까이 다가선 접근입니다. 단, 연구개발이나 바이오산업 전반을 시스템 관점에서 바라보는 큰 전략은 부족하다는 인상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성과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지만, 때로는 실행 구도가 뿌옇게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시스템 전체를 손질하려는 정책이 인상적이지만, 실행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연구자와 의료인을 위한 정서적 신뢰 회복에 집중하지만, 국가적 바이오 전략으로 확장하기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과학기술과 바이오를 다루는 리더십을 원하는가?” 현장을 촘촘히 설계할 관리자형인가, 담대한 산업 전략가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의 실용가인가. 당신은 누구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기고 싶으신가요? 구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
|